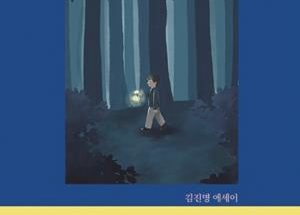셰퍼드 페어리의 전시 《셰퍼드 페어리, 행동하라!》와
뱅크시를 다룬 다큐 영화 《뱅크시》
거리미술은 미술관을 벗어나 야외에서 입장료 없이 대중과 면 대 면으로 만나는 반체제적인 창작이자 전시 행위다. 남의 눈을 피해 로빈 후드처럼 도시의 경관을 바꿔놓고 종적을 감춰 신비주의와 호감을 일으키되, 남의 건물을 낙서로 도배하는 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에 거리미술은 불법의 영역에 묶어둔다. 현존하는 거리미술의 대표 주자 둘이 여름휴가철 국내 전시장과 극장가에 소개됐다.
셰퍼드 페어리의 작업 모습 2022 COURTESY OF SHEPARD FAIREYOBEY GIANT ART INC.ⓒ
《뱅크시》 영화 포스터ⓒ(주)마노엔터테인먼트 제공
거리미술이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 배경
미국 거리미술가 셰퍼드 페어리의 《셰퍼드 페어리, 행동하라!(7월29일~11월6일 롯데뮤지엄)》와 영국 거리미술가 뱅크시를 다룬 다큐 영화 《뱅크시》가 8월11일 개봉했다. 영화 《뱅크시》에선 거리미술을 두고 ‘21세기의 새로운 미술운동’이라 주장한다. 미술사에서 최초의 미술로 기록되는 원시 동굴 벽화까지 회귀하지 않더라도, 거리미술은 1960년대 힙합 문화와 함께 런던과 뉴욕의 지하철 및 공공시설에서 성장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당시 거리미술의 일원으로 활동한 이가 20대 초반의 앤디 워홀과 어울리며 일약 저명한 현대미술가로 떠오른 바스키아나 키스 해링 같은 거리미술가였으니, 거리미술을 21세기의 새로운 미술운동으로 본다는 주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셰퍼드 페어리와 뱅크시가 본격 주목받던 2000년 이후의 거리미술이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 건 분명해 보인다. 인터넷 보급과 유명 인사의 개입도 전 시대와 다른 차원을 만드는 배경이 됐다.
20세기 중반 영미에서 형성된 거리미술의 특징은 함부로 낙서할 수 없는 공공시설과 건물의 험준한 외벽에 남몰래 태깅(tagging)하는 것이다. 태깅은 낙서 화가가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걸 뜻한다. 위험한 작업을 마치고 서명을 남겨 인정 욕구를 얻는 게 거리미술의 동기였다. 좀 더 어려운 장소를 골라 경쟁적으로 태깅하는 것이 유행이 됐다. 셰퍼드 페어리의 전시장엔 오바마 대통령 초상화가 놓인 별도의 전시실이 있다. 이 작품의 원형은 2008년 미국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 후보 선전 포스터였다. 오바마의 상반신 아래 희망(HOPE)이라 적힌 선거 구호는 간결하고 강인하게 각인된다. 그 포스터를 두고 한 미술평론가는 1차 대전 때 미군이 징집 홍보물로 쓴 ‘I Want You’ 이후 가장 효과적인 포스터라고 칭찬했다.
오바마 대선 포스터의 성공을 분기점으로 셰퍼드 페어리의 활동 영역도 크게 확장됐고, 좀 더 민주당 친화적인 메시지로 미술 애호가를 넘어 민주당 진영이 팬으로 유입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창간 97년 만에 처음으로 로고 ‘TIME’을 지면에서 지운 적이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행한 제호의 커버에 반(反)트럼프 성향인 셰퍼드 페어리가 제작한 두건을 두른 시위 여성 초상화 위에, ‘투표하라’는 의미의 ‘VOTE’로 로고를 대체한 것이다. 당시 타임 커버를 장식한 작품도 일부 변형되어 이번 전시에 출품됐다.
(왼쪽)OBEY Star, 2019 2022 COURTESY OF SHEPARD FAIREYOBEY GIANT ART INC, Obama Hope, AP, 2008 2022 COURTESY OF SHEPARD FAIREYOBEY GIANT ART INCⓒ롯데뮤지엄 제공
셰퍼드 페어리의 제작 공식은 세상에 널리 퍼진 친숙한 도상과 인지도 높은 인물을 가져와 간략히 디자인하고 거기에 구호를 붙이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를 반복하는 국내 아이돌그룹의 후크송 편곡 방식과 닮아 중독성이 강하다. 밥 말리, 마틴 루터 킹, 앤디 워홀, 노암 촘스키 혹은 체 게바라의 초상을 어디서 본 듯한 빈티지 포스터의 틀에 담고, 그의 작품 연보에서 단골로 쓰이는 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랑색 배합에 검정 윤곽선을 더해 셰퍼드 페어리의 색채를 각인시킨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재학생 시절이던 1989년 유명 레슬러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얼굴을 스티커나 스텐실로 대량생산해 전 세계 각지에 확산시키며 이름을 알린 셰퍼드 페어리는 스티커의 일부를 간결히 변형하고 ‘OBEY’라는 단어를 결합시켜 지금 자신의 대표 도상으로 굳혔다. 간략한 도상과 구호의 결합 및 반복은 ‘셰퍼드 페어리 미학’의 전부라면 전부다. 국내 전시 제목도 짧은 구호 ‘행동하라!’다(영어 제목도 짧고 강인한 구호 EYES OPEN–MINDS OPEN).
자신의 작품에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파쇄기를 몰래 부착해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되는 순간 작품이 파쇄되는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된 영국 거리미술가 뱅크시는 보기 드물게 신원미상의 불가사의한 작가다. 파쇄 당시 약 15억원에 판매된 작품은 3년 후 경매에서 20배가 넘는 약 304억원에 재낙찰되기도 했다. 유명 미술관 전시실에 엉터리 그림을 몰래 부착하고 사라지는 걸로 명성을 얻은 뱅크시지만, 여론과 언론의 주목이 본격화된 때는 그의 전시장에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같은 셀럽이 방문하면서다.
뱅크시 벽화
극소수 취향의 미술계 생리를 길거리로 가져온 ‘예술 민주화’
거리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창작하는 것에서 출발한 셰퍼드 페어리와 뱅크시의 제도권 내 대성공을 보노라면 이 대반전이 왠지 이율배반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상식일 터다. 작품에 담긴 반체제 메시지하며, 극소수 취향의 미술계 생리를 길거리로 가져온 ‘예술 민주화’로 환호를 받은 이들이니 말이다. 하지만 셰퍼드 페어리의 전시장과 뱅크시를 상영하는 극장에서 이 둘의 완성도 높은 작업과 성공 행보를 거리를 두고 순전한 관람 대상으로 즐기다 나오는 스스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괴상하지만 일반의 상식이다.
셰퍼드 페어리와 뱅크시 모두, 활동 초반에 제도권 입성을 염두에 둔 수를 쓴 건 아닐 것이다. 두 거리미술가의 미술 대중화 정신에 현대미술이 불편했던 일반인이 환호했을 테고, 자연스레 늘어난 대중적 수요로 몸값이 올랐을 테고, 일약 거리미술 분야 최고의 지위에 당도한 것이리라. 낙후된 거주지를 관 차원에서 재생하자, 외부 자본이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결과 원주민이 자리를 내주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성공의 역설’의 인물 버전쯤 된다. 본래 취지에 반해 하위문화가 성공하는 역설은 거리미술가들이 공유했던 펑크록, 스케이트보드 같은 하위문화가 중산층 이상의 레저로 정착된 것처럼, 삶의 생태계에선 특별한 사건조차 아니다. 셰퍼드 페어리나 뱅크시가 그들의 발언 기회, 바꿔 말해 인지도와 발표의 장을 보장하는 언론의 주목과 시장경제의 보조를 거부할 리 없다. 그것이 이율배반을 만든다 한들 정치적 올바름의 레토릭을 공식처럼 반복하면서 더 세련되고 수준 높은 결과물로 균질화되는 편을 택할 것이다. 이 같은 자기 타협도 괴상하지만 생태계의 상식에 가깝다.
미술작가를 격려할 때 내가 평소 하는 말이 영화 《뱅크시》에서 나오는 걸 봤다. 워딩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뉘앙스의 자막. ‘갑자기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현대미술이야.’
This article is from https://www.sisajournal.com/, if there is any copyright issue, please contact the webmaster to delet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