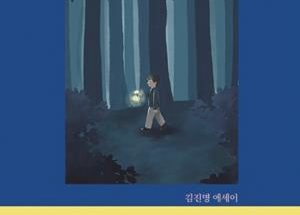이정재의 주목할 만한 데뷔작, 영리하고 치밀한 영화
열어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이정재가 연출한 《헌트》(메가박스)를 올여름 텐트폴(성수기 대작) 시장의 최고 기대작으로 뽑는 시선은 많지 않았다. 경쟁작인 《외계+인》(CJ), 《한산》(롯데), 《비상선언》(쇼박스)을 연출한 감독들의 면면이 화려했던 게 첫 번째 이유. 배우 출신 감독 작품이라는 선입견 역시 《헌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영화시장이 짐작만으로 움직였던가. 모습을 드러낸 《헌트》는 첩보물 특유의 활력이 역사적 사건과 영화적 상상력 사이를 매끄럽게 유영하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건 30년간 현장을 누빈 경험에서 파생된 이정재의 내공, 치밀하게 짜인 각본, ‘사나이 픽처스’의 제작 노하우, 이정재-정우성 콤비의 시너지다.
때는 바야흐로 1983년. 신군부의 쿠데타가 나라를 벌집으로 쑤신 지 4년이 흐른 시점이자, 광주를 할퀸 상처가 사회를 음울하게 뒤덮고 있던 시대다. 그 중심에 군사독재를 옹호했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있다. 중앙정보부 출신의 박평호(이정재)가 이끄는 해외팀과 군인 출신의 김정도(정우성)가 진두지휘하는 국내팀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가운데, ‘동림’이라는 암호명의 북한 간첩이 안기부 내에 침투해 있다는 정보가 접수된다. 안기부 국장은 김정도에게 박평호를, 박평호에게는 김정도를 캐보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린다.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모는 일이 빈번했던 시절. 박평호와 김정도는 예감한다. 아, 찍히면 죽겠구나! 살아남기 위해선 상대가 동림이 되어야 하는 상황. 두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노리며 덫을 놓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체를 만난다.
영화 《헌트》 포스터ⓒ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공
역사적 사건과 영화적 상상의 절묘한 균형
《헌트》를 보며 신인 감독 이정재에게 놀라게 되는 첫 지점은 탄탄한 시나리오다. 2016년 《헌트》의 원작 시나리오인 《남산》 판권 구매 후, 연출을 맡아줄 감독을 찾다가 수차례 거절당하자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는, ‘어쩔 수 없어서’ 써내려가게 된 사람의 것이라는 게 엄살(물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로 보일 정도로 짜임새 있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두터운 레이어가 특히나 흥미롭다. 비밀이 하나둘 벗겨질 때마다 이야기 흐름이 방향을 틀며 또 다른 서사로 뻗어가는 식인데, 이 모든 게 거대한 물줄기 안에서 아귀가 맞게 통합되는 짜릿함이 있다.
영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공군 이웅평 대위 귀순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끌어오되, 이를 극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배경으로 배치해 영화적으로 재가공했다. 극적 재미를 위해 픽션에 무리수를 두면 역사 왜곡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실화의 무게에 너무 짓눌리면 장르적 재미가 반감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추를 매끄럽게 잘 잡았다.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첩보 액션 장르를 빌린 것이 아니라, 첩보 액션과 캐릭터들의 딜레마를 보여주기 위해 시대로 걸어들어간 영화라는 흔적이 극 전반에서 발견된다.
스파이물로서의 재미를 포획하는 건 여러모로 《헌트》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동력으로 심은 건 ‘동림은 누구인가’를 두고 관객에게 제안한 ‘밀당’이다. 박평호와 김정도 중 누가 스파이인지. 혹은 둘 다 아닌지. 스파이가 맞다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아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내 편이라 믿는 저 사람은 진짜 내 편이 맞는지. 음모와 배신을 미끼로 삼아 영화는 관객의 시선을 잡아끈다. 그리고 이 밀당을 꽤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손잡아야 하는 인물들의 딜레마가 흑과 백의 이분법에 함몰되지 않고 녹진하게 담겼다.
영화 《헌트》의 한 장면ⓒ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공
단점을 상쇄하는 액션
물론 《헌트》에도 약점은 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영화라는 점인데 각기 다른 신념과 목적을 지닌 진영이 뒤섞여 있는 데다, 다들 속에 능구렁이 하나씩 심은 채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역사적인 배경까지 삽입돼 인물들의 동기를 추리하게 하니 클라이맥스까지 발맞춰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
앞서 이야기했듯 아귀가 잘 맞아떨어지는 각본이기에 흐름만 잘 따라간다면 영화 끝에서 충만함을 얻을 테지만, 아니라면? 중간에 흐름을 하나라도 놓치면 인물들 감정선에 대한 감상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역사적 사건이 두 인물의 신념은 물론 행동의 동력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그 배경을 잘 모르는 세대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여지도 있다. 먼저 공개된 칸국제영화제에서 외신 평가가 엇갈린 것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트》는 이러한 약점을 돌파할 무기도 영리하게 심어뒀다. 내러티브의 압박을 상쇄시키는 건 액션. 대통령 암살 시도를 둘러싼 총격전이 펼쳐지는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자신들의 지향하는 바를 우렁차게 드러내는 영화는 이야기 길목 길목에 액션을 능동적으로 배치해 관객 이탈을 막는다. 게다가 이 액션들은 장르적 쾌감이라는 목적을 위해 충무로 프로 스태프들이 달라붙어 공을 들였다는 티를 역력히 내뿜고 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의미다.
워싱턴-도쿄-방콕으로 이어지는 액션이 단순히 시각적 재미에 머물지 않고, 처한 딜레마에 리액션하는 박평호-김정도 심리에 깊게 결부돼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 모든 걸 관장한 이정재의 연출력과 더불어 언급해야 할 것은 제작에 참여한 ‘사나이 픽처스’의 노하우일 것이다. 《신세계》 《공작》 《아수라》 등 선 굵은 작품을 만들어온 사나이 픽처스의 경험치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음이 자명하다.
이정재-정우성, 23년 만의 만남
이러거나 저러거나 《헌트》가 여타 영화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정우성-이정재 콤비의 투 샷을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20년 넘게 ‘청담 부부’로 불리며 각별한 우정을 다져온 두 배우를 잘 아는 관객 입장에서 각별하게 볼 법한 관계의 설정들이 있다.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대립하며 절정의 순간을 향해 내달리는 두 사람이 한 프레임 안에서 팽팽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의 박력이 상당하다.
영화 외적 요소가 극 안으로 침투하는 셈인데, 그것이 극의 흐름을 방해하기는커녕 몰입감을 높이는 건 단순히 그 관계가 정우성-이정재여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 영화에는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센티멘털한 신이 없다. 투톱 영화라는 장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치장하거나 감성적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자기 신념을 따라 냉정하게 내딛는 경계에 선 두 남자가 있을 뿐이다. 《헌트》가 프로들의 영화로 보인다면, 그것은 영화에 참여한 프로들의 실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우성-이정재가 영화를 대하는 자세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두 배우의 23년 만의 재회라는 점을 넘어선 의미들이 이 영화엔 있다.
또 하나 확인한 것. 배우 출신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연기자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사려 깊게 이해한다는 점일 텐데, 《헌트》는 여기에 더해 ‘사랑하는 배우를 연출자가 찍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가’도 보여준다. 이정재는 오랜 동료이자 절친인 정우성을 어떤 각도에서 잡아야 그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찍어야 최고가 나올 수 있는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괜히 부부로 불리는 게 아니라니까. 백년해로하시길!
배우 출신 감독, 성공 사례가 필요해
벤 애플렉, 조디 포스터, 로버트 레드퍼드, 멜 깁슨, 에단 호크, 클린트 이스트우드….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간파했겠지만, 연기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배우들이다. 감독 겸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워낙 많은 탓에 할리우드 동네에서 이것은 이젠 큰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카메라 앞에 선 배우가 연출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은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 《용의자X》 《집으로 가는 길》 등을 연출한 방은진을 필두로 유지태·하정우·문소리·정진영·구혜선·김윤석 등이 ‘디렉터스 체어’에 앉았다. 여러 사례에도 할리우드와 달리 ‘배우 출신 감독’에 대해 국내 관객이 장벽을 쌓고 보는 것은,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탄탄한 믿음을 줄 정도로 자리 잡은 이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헌트》의 결과가 사뭇 궁금한 건, 이 영화가 ‘배우 출신 감독’에 대한 선입견을 새롭게 재편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선례의 힘은 중요한 법.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는 평단과 대중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작품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from https://www.sisajournal.com/, if there is any copyright issue, please contact the webmaster to delet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