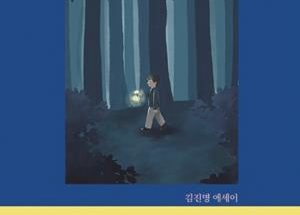6년 만에 컴백해 예능부터 영화까지 섭렵
배우 김우빈이 돌아왔다. tvN 예능 《어쩌다 사장2》에서 에이스 알바생으로 서글서글한 매력을 십분 발휘하더니, 곧바로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안방극장을 접수했다. 지금까진 워밍업이었다. 영화 《외계+인 1부》로 본격 스크린 복귀 채비를 마친 것. 2017년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이후 첫 촬영 역시 《외계+인 1부》였다.
영화 《외계+인 1부》는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전우치》(2009), 《도둑들》(2012), 《암살》(2015) 등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김우빈을 비롯해 류준열, 김태리, 소지섭 등이 출연한다. 극 중 김우빈은 외계인 죄수의 호송을 관리하는 ‘가드’ 역을 맡아 고난도의 특수 액션을 소화했다. 최동훈 감독은 “언제나 김우빈 배우와 영화를 같이 하고 싶었고, 그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스물여덟’ 청춘 배우에서 어느덧 ‘서른셋’ 우아한 남자로 돌아온 그를 직접 만났다.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오랜만이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설렌다.
“기자들과 만나는 게 6년 만이다.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관객들을 오랜만에 만나려니 설레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행복하고 긴장되는 나날이다.”
건강은 어떤가.
“치료가 끝난 지 5년이 됐다. 지난주 검사를 받았다.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하더라. 많은 분이 응원해준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복귀 후 첫 촬영을 기억하나.
“예능과 드라마로 먼저 인사를 드렸지만, 첫 촬영은 《외계+인 1부》 현장이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스태프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그 마음이 오롯하게 느껴져 울컥하고 감동적이었다. 첫 촬영 때 날씨가 추워 다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세트장엔 온기가 넘쳤다. 나 역시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영화는 어떻게 봤나.
“나는 내 연기를 편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봤다(웃음). 지금까지 두 번 봤는데, 처음 볼 땐 내 장면만 나오면 귀가 뜨거워지고 땀이 흐르더라. 아쉬운 것들이 보이니까 그렇다. 다행히 다른 배우들의 분량이 많다 보니 그런 장면은 웃으면서 편안하게 봤다. 두 번째는 관객 입장에서 즐기면서 봤다. 장면마다 배우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 의미 있었다.”
최동훈 감독과의 인연도 화제다(최 감독은 2017년 금융범죄 영화 《도청》을 함께 준비하던 김우빈이 암 진단을 받자 《도청》을 중단하고 새 작품을 구상했다. 바로 《외계+인 1부》다).
“당시 감독님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회복에만 신경 쓰라고 말해 주셨다. 빨리 되돌아가자는 마음에 건강에만 신경 썼다. 하늘이 나에게 휴가를 줬구나 싶었다. 치료하면서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고 복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감독님이 《외계+인 1부》의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도청》을 하려다가 나로 인해 중단됐기 때문에 만약 내게 컴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최 감독님과 하고 싶었다. 시나리오를 보지 않더라도 감독님이 필요로 하면 무조건 달려가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시나리오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설득도 하셨다(웃음).”
극 중 로봇으로 변신한다. 영웅 같은 느낌이랄까?
“정말 좋았다. 로봇의 모습이 단단해 보이고 멋있지 않았나. 거기에 음향효과까지 들어가니 “우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나 성공했네!’ 싶었다(웃음). 내가 어떻게 이런 영화에 이런 캐릭터로 출연할 수 있을까?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행복했다.”
재미있었던 장면 중 하나는 1인 4역으로 김우빈 4명이 동시에 화면에 등장하는 거다.
“내가 4명이 나오다니! 징그러웠다(웃음). 배우로서도 쉽지 않은 경험이다. 나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한다.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렵긴 한데 재미있지 않나. 컴퓨터그래픽(CG)으로 그려 넣을 이미지가 많다 보니 없는 것도 있는 듯 상상하며 연기하는 게 필요했다.”
로봇이나 SF 영화를 즐겨 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참고하기도 했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로봇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로봇보다 레고를 좋아했다. SF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외계+인 1부》를 하기로 한 이후엔 상상이나 생각이 닫혀버릴 것 같아 안 봤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캐릭터였다. 그래서 처음엔 어렵고 무서웠는데, 반대로 정답이 없으니 내가 하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기게 됐다.”
최동훈 감독의 현장은 어땠나.
“다시 가고 싶은 현장이다. 감독님과 작업해본 사람들은 모두 감독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를 알겠더라. 감독님의 에너지가 너무 좋다. 밝다. 그 밝음이 주변 구석구석에 전달된다. 스태프와 배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대화할 때마다 그 사랑이 전달된다. 아이디어가 많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걸 즐기신다. 그런 순간이 행복했다.”
영화 《스물》, 드라마 《상속자들》 《학교 2013》 등등 또래 배우들과 출연한 작품이 많았다. 20대를 거쳐 30대가 됐는데 차이점이 있나.
“거의 없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고민의 정도가 작은 건 아니다. 30대가 돼도 대화하는 건 비슷하다. 다만 20대 때보다 경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결국 책임감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대중과 먼저 만나게 됐다. 자신이 느낀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점은 뭔가.
“두 곳 모두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었다. 물론 드라마는 확실히 이동도 많고 바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도 느낄 새가 거의 없었다. 더구나 극 중 배경이 되는 시장 장면은 하루에 몰아 다 찍었다.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 반면 영화는 여유가 있다. 하루에 한두 장면만 촬영하니 현장에서 계속 대화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다. 홍보 기간엔 또 더 끈끈해진다.”
오랜만에 돌아온 촬영 현장은 무엇이 달라졌나.
“못 보던 장비가 많이 생겼다(웃음). 촬영감독님이 배우 앞에 없고 원격으로 조정하며, 조명도 헤드로 조정한다. 휴대폰으로 각자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것도 신기했다. 《외계+인 1부》 촬영장에는 나보다 12세나 어린 동생도 있더라. 일을 20세 때부터 시작해서인지 현장에서 내가 막내인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덧 나보다 어린 친구가 등장한 걸 보니 새삼 책임감이 느껴졌다.”
6년 공백기가 지나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연기에 대한 생각, 나아가 인생관에도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연기가 그리웠다. 지금은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 힘들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강박에 싸여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위로를 안 했더라. 그게 슬프더라. 이제는 스스로를 아껴주려 노력하고 있다. 소소한 것에 칭찬해 주고,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준다.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았을 때는 자책하기보다는 받아들인다. 나를 사랑하게 되니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따뜻해지고 관대해졌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전만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내가 실수하듯 그도 그렇겠지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을 관찰하고 마음을 더 느껴보려고 한다. 연기할 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한다. 내가 호흡하는 캐릭터에 더욱 공감하게 된다. 상대 배우 대사에도 더 귀 기울이게 된다. 여러모로 변화가 생겼다.”
어떤 30대를 보내고 싶은가.
“어릴 때는 항상 마흔이 되고 싶었다. 마흔의 배우는 뭔지 모르게 멋있더라.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마흔도 멋있지만, 지금의 내가 좋다. 서른세 살을 살고 있는 지금이 좋다. 뭔가 다시 시작해도 늦은 것 같지 않고,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여유도 생긴 것 같다. 현장에서도 더 즐겁다. 내 일과 내 나이를 오롯이 즐기는 30대를 보내고 싶다.”
This article is from https://www.sisajournal.com/, if there is any copyright issue, please contact the webmaster to delet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