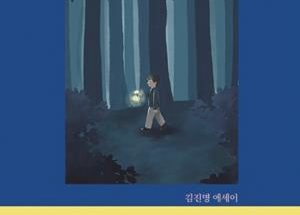시대를 반영하기보다 유행에 휘둘리는 현대미술
작가의 존재론 보여준 《이샛별 Green Eyes》 주목
“‘본인에게 미술 창작은 어떤 의미인가’처럼 작가 존재론에 가까운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 미술창작 스튜디오의 입주 작가이던 이샛별을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에 초대해 만난 후 남긴 5년 전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술작가의 삶은 작품만큼이나 호기심을 일으킨다. 현실의 삶과 어딘지 동떨어졌을 법한 창작활동에 더해 미술을 향유하는 극소수의 수요자까지 고려한다면, 전업 미술가는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진다. 국내 미술시장의 호황 관련 보도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어떤 갤러리와 작가들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도 꾸준히 들려온다. 하지만 필자는 이 이상 과열이 오래갈 거라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미술판의 부침에서 초연하게 창작하면서 소신과 독창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존재 이유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사각 숲》, 162.2×130.3cm, 2022ⓒ이샛별 제공
특정 색채와 예술가 개성 묶어 미적 효과 극대화
서울 서촌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집결한 힙 플레이스지만, 이곳에도 눈에 띄지 않는 갤러리 두엇이 있고 그중 한 곳에서 5년 전 존재론 대화를 나눈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샛별 Green Eyes》(7월7~30일, 드로잉룸). ‘녹색 눈’ 정도로 번역될 법한 제목의 전시에는 인물의 눈매는 물론이고 인체와 배경화면을 초록으로 채색한 그림들이 걸려 있다.
범상한 예술가 집단과 차별되는 특정 예술가의 개성을 묘사할 때 곧잘 ‘색채’라는 상징어를 쓴다.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진짜 특정 색채와 예술가의 개성이 한 묶음으로 엮여 미적 효과를 키우는 경우는 적지 않다. 반 고흐는 노란색과 한 묶음으로 기억된다. 프랑스의 현대미술가 이브 클라인은 코발트 블루나 울트라 마린 블루처럼 기존의 파란색에 가까운 색채를 고안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국제적인 클라인 블루(International Klein Blue)’라는 고유명사를 짓고 특허까지 냈다. 이샛별은 이번 전시에 앞선 몇 차례의 개인전에서 녹색을 제목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초록빛이 지배하는 그림 연작을 줄곧 발표하고 있다. 녹색은 빨강, 파랑, 검은색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진 않지만 인체 묘사에 그 색이 사용되면 기묘한 비현실감이 흐르는 화면이 출현한다.
이샛별 작가의 《그린 아이즈》 전시 포스터ⓒ드로잉룸·이샛별 제공
《슬퍼할것이없다》, 20.5x27cm, 2022ⓒ드로잉룸·이샛별 제공
얼굴과 한쪽 손을 한 쌍으로 화면에 담은 초상화 연작들에선 여러 각도에서 그려진 퀭한 눈알의 젊은 여성 얼굴이 나타난다. 동공이 사라진 여성의 얼굴 그림은 녹색 고유의 차가운 기운을 덧입으면서 조각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그림은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이런 그림의 의미는 뭘까? 미술 감상문이나 평문은 작품에서 이야기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실제로 어떤 이야기 또는 의미를 담은 미술이 있으며, 그런 미술이 판촉에도 용이하다. 왜냐하면 미술은 구체적인 의미나 교훈과 결합해 설명돼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야기나 의미와 연결되기 어려운 미술도 있다. 아니 많다. 살색이 아닌 녹색 피부에, 얼굴만이 아닌 손 한쪽과 얼굴이 한 세트로 묶인 그림은, 초상화를 바라보던 익숙한 감상법을 피해 간다. 한 점도 아니고, 손 한쪽과 얼굴이 묶인 여러 점의 초상화에선 작가의 그리는 행위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작가의 존재감이 와닿는 미술.
자기 색채를 선점한 이샛별의 창작 여정에는 녹색의 발견 말고도 일관성이 몇 개 따라다닌다. 화면에 묘사된 ‘깨진 디지털 픽셀’ 도상은 이전부터 구사했던 이샛별의 또 다른 색채. 숲을 배경으로 서있는 인물의 얼굴이 깨진 원형 픽셀 모양으로 대체됐다. 이전에 발표한 풍경화와 인물화에선 화면 중앙에 뜬금없이 '파일 오류' 표시나, 인물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묘사가 있었다. 현대인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더러 확인하는 파일 오류 표시를 무심히 흘려보낸다. ‘깨진 디지털 픽셀’ 그림은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세상을 접하는 지금의 시각 조건에 대한 미술가의 경험주의일 것이다.
의사소통의 플랫폼이 디지털로 재편된 세상을 향한 풍자는 ‘깨진 픽셀’ 그림 말고도 정밀한 묘사법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다. 녹색 얼굴 초상화 연작과 함께 소녀의 얼굴을 연필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묘사한 드로잉 연작도 전시장에 보인다. 예의 동공이 사라진 한 소녀의 얼굴을 동그란 프레임에 옮겨놓은 이 드로잉은 기묘한 비현실감을 정교한 필치로 실어 나른다. 6년 전에 발표한 이샛별의 드로잉 전시를 떠올려 본다. 새부리 형태의 고깔모자를 얼굴에 뒤집어쓴 소녀들을 상하좌우로 대칭시켜 데칼코마니 방식의 반복 패턴처럼 만든 드로잉으로, 정교한 수공이 돋보인 작업이었다.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는 그때 드로잉 작업은 판화나 디지털 프린팅으로 쉽게 재현할 수 있는 화면이었다. 디지털 재현이 지배하는 시각예술의 흐름 앞에, 외관을 정밀하게 묘사하되 2000년 이전 세상의 창작법을 고집한 그 드로잉 작업을 보며, 어느덧 잊히는 순수미술 창작의 미덕을 환기했던 기억이 필자에게 있다.
《그린 아이즈》 전시 전경ⓒ드로잉룸 제공
NFT아트 출연으로 미술계 버블 심해져
작년 미술시장 과열 보도와 나란히 미술판을 들었다 놓은 또 하나의 이슈는 NFT아트였다. 그것이 미술계에서 정신적 유행으로 떠오른 데는, 작은 노력의 복제만으로 일확천금을 얻었다는 외신 보도의 영향이 컸다. NFT아트의 상징적인 성공사례로 지목되는 ‘크립토 펑크’는 2017년 제작된 8비트 저해상도 화질의 제각각 다른 1만 개의 얼굴 아이콘 시리즈다. 크립토 펑크는 처음 1만 개 가운데 9000개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후 1000개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로 제작해 팔았다. 크립토 펑크 중 외계인 얼굴을 한 7523번 NFT는 2021년 소더비 경매에서 약 140억원에 거래됐다.
8비트의 디지털 파일 하나가 희소성(각기 다른 얼굴이라지만 1만 개를 과연 희소성이라 할 수 있을까?)과 고수익 투자에 대한 소문과 쏠림으로 형성시킨 부풀려진 가치다. 예술이 시대를 반영한다지만, 시대의 유행에 휘둘리는 예술도 있다. 고정불변한 예술의 가치가 있다고 믿진 않는다. 그렇지만 근래 몇 년 사이 경제적 수치를 기준으로 주목받은 어떤 예술 현상들은 시대를 반영했다기보다 시대의 유행에 휘둘린 경우라고 필자는 본다. 작품 판매 외에 수입원이 있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샛별이 익살맞게 보내온 카톡은 자기 풍자와 고난이 담겨, 보자마자 폭소와 연민을 자아내는 전업작가의 회신이었다.
“남친? ㅎㅎㅎㅎㅎ 재난지원금? ㅋㅋㅋㅋㅋ”
This article is from https://www.sisajournal.com/, if there is any copyright issue, please contact the webmaster to delet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