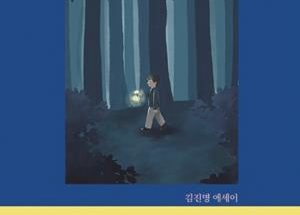소설가 김인숙의 《1만 1천 권의 조선》
우리나라가 근대로 들어서는 시기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구석들이 있다. 청나라나 일본은 근대 이전에 서양과 접했는데, 조선은 상대적으로 그런 교류가 없었는지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활을 쏠 때 일본은 조총을 개발했는데도 조선은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국에 문호를 닫았다. 이런 흐름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로까지 이어졌다. 이 의문이 서양이 조선을 보는 시각을 형성한 《하멜표류기》에서 연원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서양 서적에 가끔씩 등장하는 조선은 이 책을 통해 ‘무시무시한 야만의 나라, 잘못 붙잡히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얻었다.
1만 1천 권의 조선│김인숙 지음│은행나무 펴냄│440쪽│2만2000원
1963년생 작가군 중 한 명인 김인숙 작가는 서구인들이 기록한 한국 관련 기록을 찾는 흥미로운 작업에 몰두했고, 결과물로 《1만 1천 권의 조선》을 출간했다. 하멜 이전에 서구의 책은 어땠을까. 9세기 무렵 아랍 역사서에는 “중국 동쪽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홉 명의 왕이 다스리며 금이 많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구절이 있고, 845년 아라비아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이븐 후르다드베는 “그곳을 방문한 여행자는 누구나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심지어 그곳 주민들은 개의 쇠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테도 금으로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 좋은 느낌이다. 1644년 중국 항저우에서 선교사를 지낸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 마르티니는 《타르타르의 전쟁》에서 쌀과 밀이 풍부하고, 인삼과 진주가 유명하며, 배의 맛이 뛰어나다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 허락 없이 결혼도 하는 자유연애의 나라라고 썼다.
이렇듯 작가는 서구의 시각에서 우리 선조들을 본 기록들을 하나하나씩 더듬어간다. 물론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1653년 8월16일 난파 후 조선에 억류돼 13년을 보낸 하멜 일행의 기록. 가장 살풍경하게 우리 선조를 서방에 보여줬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내용이 하멜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 편집자나 출판업자에 의해 더 강도가 세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향교에 관해 “조선의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죽음에 처한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에 관해 쓴 책을 읽는다”는 황당한 묘사까지 있을 정도다. 서구에서 우리를 다룬 책을 여행하는 것은 단조로운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너무 재미있다. 1900년 전후에 조선을 방문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본 뒤크로와 부정적으로 본 로티의 시선처럼 인간은 주관적인 시선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서구가 한국을 본 흥미로운 것들은 책 전반에 있다. 《조선과 사라진 열 지파》를 쓴 맥레오드는 조선인의 용모가 백인과 닮았고, 단군의 얼굴이 튜턴족과 흡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조선이 이스라엘의 사라진 열 지파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책은 각 장마다 각기 다른 주제의식을 가진 책들을 통해 독자들을 사로잡고는 결국 작가가 소개하는 책을 검색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기록들을 통해 수많은 상상의 가지를 만들어낸다.
This article is from https://www.sisajournal.com/, if there is any copyright issue, please contact the webmaster to delete it.